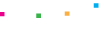종목 정보
밀양새터가을굿(1984,경상남도)
종목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참여대회 |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 참여지역 | 경상남도 |
| 분야 | 민속놀이 |
종목소개
이곳 밀양의 새터 마을에서는 영험있는 당산선왕이 있어 오랜 옛날부터 정월과 시월에 기풍안택하는 고사를 지내고 ‘가을굿’을 하면서 밤새워 즐겁게 노는 풍습이 전해오고 있다. 고증내용에 따르면 이곳 새터 마을은 농경지가 넓은 천혜의 농사고장으로서 임진왜란 때 박이눌이란 사람이 장조카 범에게 살림을 물려주어 터를 닦고 살게 된 때부터로 전해오고 있으며, 당산은 서낭옷에 쓰여져 있는 명문에 따르면 순치 세조원년에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나 중개수를 해가면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다. 서낭옷에는 청황룡이 여의주를 감싸고 있는 그림과 여덟 방위에 ‘건유부오선술랑자’라 표시되어 있어 풍요를 염원하는 농경민의 오행과 용 숭배사상이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곳에서 매년 정월과 시월상달에 고사를 지낸다. 정월에는 일년동안 안녕과 풍년을 빌며 시월상달에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감사하는 고사를 지내고 ‘가을굿’을 한다. ‘가을굿’은 이 마을에서 부유하게 살던 박참봉이 ‘가을굿’을 할 때 잔치를 크게 벌려 놀게 한 때가 가장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놀이는 밀양 새터에서 ‘가을굿’을 할 때 벼타작을 하는 협동작업 과정을 엮어 풍년을 구가하면서 신나게 노는 색다른 놀이이다. 그동안 일제의 민족혼 말살정책으로 마을단위 행사는 중단되고 개별적으로 삼신단지의 쌀을 햇곡식으로 갈아주고 안택도 하고 당산에 나아가 불을 켜고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원래의 ‘가을굿’에 연유하여 풍년이 들어 제때에 가을마당(타작과 보리갈이)이 순조롭게 끝나고 나면 마을에서 얼마씩 추렴을 해서 당산제를 지내고 추수감사행사로 풍년잔치를 벌여 왔으며 1969년부터 “밀양 아랑제”때 ‘폐막의 밤’ 행사로 성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처음에는 ‘공상타작’이란 이름으로 행해 왔으나 조예있는 이의 의견과 지방민의 여론에 따라 옛이름 그대로 ‘가을굿’에다가 지명을 붙여 ‘밀양 새터 가을굿’으로 하여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놀이의 특색은 새터 사람들의 서낭신에 대한 신앙심이 강하므로 추수를 마치고 햇곡식을 서낭신에 바치고 감사하는 공연적 성격을 띤다는 점과 재래의 전통적 농구가 총망라 된다는 점일 것이다.
내용
길군악(길굿)으로 입장하여 첫 번째 <고사마당>은 강신-분향-헌작-소지-축원-배례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제관이 먼저 춤을 추고 따라서 참례자가 덧배기와 굿거리 춤을 추는 것을 공신무라 한다. 두 번째 <공상타작>은 볏단 대신에 짚단을 날라주고 또 넘겨주기도 하고 볏단을 들고 공상 앞에 와서 땅에 댔다가 공사 위에 좌우로 치면서 타작을 하는 것이다. 타작이 끝나면 까꾸리로 나부리고 비질을 한다. 중중모리(염불조, 험율사 가락)장단이 쓰인다. 세 번째 <가을 작 마당>에서는 가래로 나락을 다루고 풍석으로 부치고 챙이(키)로 까불고 벼 이삭은 홀깨로 훌러내고 대칼로 벼알을 터는 순서이다. 꺼꾸리로 거부재기를 끌고 비질을 한다. 한편에서는 ‘섬’을 만들고 새끼를 꼰다. 말질을 해서 ‘섬’에 넣고 ‘섬’을 묶어 작을 한다. 볍씨를 ‘오장치’에 담아서 운반하고 섬을 ‘등패’에 올려지고 운반한다. 중중모리(도드리)장단을 친다. 네 번째 <뿍대기 타작>은 목도리개의 앞소리에 따라 뒤를 받으면서 도리깨로 타작을 하는 순서이다. 종도리개는 뿍대기를 깔아내기도 하고 아래위로 뒤집어 주면서 타작을 한다. 타작이 끝나면 까꾸리로 거부개기를 끌어내고 비질을 한다. 느린 단모리(모라치기)장단을 친다. 다섯 번째 <목메놀이>에서는 챙이(키) 또는 짚소쿠리, 자루바가지 등으로 벼를 목메어 넣어주고 앞소리(목메노래)에 따라 뒷소리(호호 목메야)를 받아 부르면서 목메갈이를 한다. 굿거리와 덧배기 장단을 사용한다. 마지막 <판굿>에서는 중중모리(영산 다드래기)를 치며 모든 놀이꾼과 구경꾼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는 마당이다.
밀양새터가을굿을 할 때는 많은 소품이 필요한데, 우선 선왕대(서낭)와 놀이기(새터 가을굿)․농기가 필요하고, 나발․매구(꽹과리)․징․장고 등의 악기가 사용된다. 그리고 북공상(갱상)․목메(메통)․도리깨․덕석(멍석)․풍석․가래(넉가래)․챙이(키)․훌깨(벼훑이)․대칼․말․자루바가지․까꾸리․왕거시리(왕비)․당그레(고무레)․오장치(씨앗 넣는 작음 섬)․섬․새끼․등패․지게․볏단(짚)․관솔불 등의 많은 농기구가 필요하다. 고사를 지낼 때 필요한 제물과 제기로는 오곡(콩․팥․수수․지간․겉보리)․농주․백편․명태․과일․제상․향로․촛대․기름불․소지종이․버지기(버치․자배기)․양푼이․큰바가지․함지 등이 필요하다.
<새터 가을굿 축원문> 선왕님 선왕님 우리새터 선왕님 천만길 높이앉아 천하만사 알고시니 미련한 어진백성 비손발원 들어주소 올해해운 갑자년에 풍년들게 하옵시고 어진백성 거다시나 탈없이도 살게하여 오곡백과 햇곡식을 선왕님께 드리오니 맛있게 드시옵고 저이들 어진백성 동서남북 다댕겨도 남의 눈에 꽃이되고 재수소망 이루옵고 무병장수 비나이다
자료출처
- 출처 : 『한국의 민속예술 50년사』
- 발행연도 : 2009.12.31
- 발행 :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문서자료
| 파일명 | 요약 |
|---|---|
|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밀양새터가을굿 프로그램북 |
민속곳간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입니다.
출처 표기 후 사용가능하나, 상업적 이용 및 내용을 변형 또는 재가공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