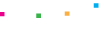종목 정보
아웨기와 흥애기소리(1986,제주도)
종목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참여대회 |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 참여지역 | 제주도 |
| 분야 | 민요 |
| 수상(단체상) | 공로상 |
종목소개
<아웨기>와 <홍애기>는 밭매는 노래의 일종으로,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 마을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희귀한 노래이다. 1986년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제주도의 민요는 대부분 노동요인데 그중 밭매는 노래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불리운다. 그러나 보통 <사릿소리>라는 곡만 전할 뿐이고 성읍마을에서만 유일하게 <아웨기>와 <홍애기>소리가 불려진다. 이런 연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으나 이 고을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한 가지 추측은 가능하다. 제주도는 1416년(태종16년)에서 1914년까지 약 500년동안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성읍마을은 정의현이 도읍지였으므로 정의고을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5세기에 걸친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이곳 정의고을은 기녀들을 통하여 육지본토의 민요를 다수 받아들였다. 따라서 성읍마을에서는 제주도 고유의 민요와 조선본토의 민요가 뒤섞여 불려왔는데 <아웨기>와 <홍애기>도 본토 민요의 영향을 받고 제주도 고유의 정서를 담은 노동요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아웨기>와 <홍애기>소리는 한 여름철 뙤약볕 아래서 조밭을 매며 부르는 노래이다. 메기고 받는 선후창의 장구한 가락으로 번져 흐르게 되면 더위도 잊고 한결 수월하게 김매기 작업을 한다. 제주도에서도 정의고을 성읍에서만 특이하게 불리는 이 노래들은 육지 본토 민요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음이 특징적이며, 가사노동과 농삿일, 그리고 바닷일까지의 3중고를 짊어진 제주 여성들의 고단함이 절절히 깃들어 있다.
내용
(1) 김매기 작업(1)_ 수눌음꾼(밭매는 일꾼들)들은 제주 고유의 대채랭이를 머리에 쓰고 호미로 김을 맨다. 선소리꾼이 <아웨기> 소리를 선창하면 수눌음꾼들이 후렴을 합창한다. (2) 김매기 작업(2)_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김매기작업이 시작되는데, 선소리꾼이 <홍애기>소리를 선창하고 수눌음꾼들이 일제히 후렴을 받는다. (3) 춤마당_ 김매는 작업을 모두 끝내고 잡역꾼, 수눌음꾼, 악사 등 모두가 한데 어울려 <삼마동동> 노래와 악기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춤마당을 이룬다.
문화재 지정 현황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1989.12지정)
관련링크
자료출처
- 출처 : 『한국의 민속예술 50년사』
- 발행연도 : 2009.12.31
- 발행 :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민속곳간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입니다.
출처 표기 후 사용가능하나, 상업적 이용 및 내용을 변형 또는 재가공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