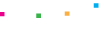종목 정보
북청사자놀이(1976,함경남도)
종목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참여대회 |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 참여지역 | 함경남도 |
| 분야 | 민속극 |
| 수상(개인상) | 개인상 (전호준) |
문화재 지정 현황
-국가무형문화재 북청사자놀음 (1967.03지정)
관련링크
자료출처
- 출처 : 『한국의 민속예술 50년사』
- 발행연도 : 2009.12.31
- 발행 :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민속곳간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입니다.
출처 표기 후 사용가능하나, 상업적 이용 및 내용을 변형 또는 재가공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