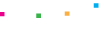종목 정보
전주승무(1973,전라북도)
종목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참여대회 |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 참여지역 | 전라북도 |
| 분야 | 무용 |
종목소개
승무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중의 하나이다. 승무에 관한 내력은 전해오는 구전(전설)에 의해 승무의 역사적 형성 배경을 불교의식무용설과 민속무용설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불교 경전 중의 하나인 법화경에 의하면 세존께서 법화경을 설할 때 채화를 내리니 가섭이 이 뜻을 알고 웃음지으며 춤을 추었다고 하며 추세의 승려들이 이를 모방하여 춤추기 시작한 것이 승무의 기원이라고 한다. 이는 말로써 전교하는 방법 외에 부처님의 공덕을 몸의 움직임으로 찬탄하는 공양으로 포교의 한 방편이 되었다고 한다. 초창기의 승무는 종교적 위엄을 갖춘 이른바 법무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조선 중엽 이후 불교의 타락으로 인해 승무가 차차 세속화되었다. 결국 종교의 뜻을 저버릴 우려가 있다고 하여 1912년 본말사법(本末寺法)의 제정에 의해 불교계에서는 금지된 후 민속무용화 되었다. 일반적으로 승무라면 파계승을 묘사하는 것이나 전주의 승무는 그와 반대로 도통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즉 수도승이 염불의 음악에 맞춰 수도하며 도통하는 과정이 연출되고 환희의 극치에 이르러 북을 치게 된다. 이 북가락은 전승되는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특색을 이루고 있다.
내용
전주승무는 (1) 염불가락, (2) 염불도드리가락, (3) 타령가락, (4) 타령도드리가락, (5) 굿거리가락, (6) 굿거리도드리가락, (7) 북치는가락, (8) 당악가락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단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염불가락_ 춤판의 가운데 뒤쪽에 있는 북을 향해 엎드려서 시작한다. 서서히 일어나 합장한 다음 앞으로 나오고 뒤로 물러나며 모든 동작이 행해진다. 장삼을 뿌리고, 젖히고, 휘돌리면서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며, 무릎을 많이 굽히는 것이 특징이다. (2) 염불도드리가락_ 염불가락의 느린 춤이 끝난 후 장단이 도드리로 바뀌며 북을 치게 된다. 염불도드리장단으로 북을 울리며 염불가락의 끝맺음을 한다. 본격적인 법고가 아니라 단순히 춤과 북치는 동작이 어울린다. (3) 타령가락_ 염부도드리가락에서 북을 치고 끝맺음을 한 후 뒷걸음으로 나와 정면을 향해 앉으며 타령가락이 시작된다. 염부가락에 비해 이 가락은 속도가 빨라지며 잦은 어깨춤이 들어간다. (4) 타령도드리가락_ 타령도드리장단에 맞추어 북을 친다. 장삼을 뿌리며 앉는 동작과 북을 치는 동작이 조화되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끝을 맺는다. (5) 굿거리가락_ 타령도드리가락에서 북을 친 후 무대 정면으로 나와 어깨춤으로부터 시작되어 본격적인 굿거리가락으로 들어간다. 염불가락, 타령가락보다 잦은가락이 많이 들어가며 훨씬 동작이 복잡해지고, 즉흥적인 멋을 표출하게 된다. 북을 칠 준비를 하며 장삼에서 손을 빼서 북가락을 쥐고 북 앞에서 얼르며 춤을 춘다. (6) 굿거리도드리가락_ 법고를 치기 위한 준비로서 타령도드리가락보다 더 빠르게 북을 친다. (7) 북치는가락_ 본격적인 법고이며, 북치는 기교를 최대한 살려 매우 빠르면서 리듬감이 넘치는 한바탕의 가락이다. (8) 당악가락_ 법고를 당악장단으로 치는 것을 말한다. 북 앞으로 뛰쳐나오며 북과 떨어져 춤추기도 하고, 다시 북으로 들어가 더욱 북을 잦은 속도로 치며 끝을 맺는다.
자료출처
- 출처 : 『한국의 민속예술 50년사』
- 발행연도 : 2009.12.31
- 발행 :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민속곳간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입니다.
출처 표기 후 사용가능하나, 상업적 이용 및 내용을 변형 또는 재가공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