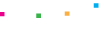종목 정보
보은북실기세배(1999,충청북도)
종목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참여대회 |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
| 참여지역 | 충청북도 |
| 분야 | 민속놀이 |
| 수상(단체상) | 공로상 |
종목소개
유래
충북 보은군 보은읍 북실마을에 전승되는 대동굿을 복원한 작품이다. ‘북실’은 본디 보은군 산내면 지역이었던 보은읍 종곡리, 성족리, 누정리, 강신리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열 두 마을이 모여 있다. 이 놀이는 ‘호무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호미씻이’를 뜻한다. 즉 벼농사의 김매기가 끝나는 음력 칠월 중순 노달기(농사일이 없는 한가한 때)에 한바탕 신명을 풀어낸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 명칭은 ‘호미가 필요 없어 깨끗이 씻어둔다’는 뜻에서 생긴 이름인 것이다.
특색
북실마을의 호무시는 열 두 마을이 한 곳에 모여 두레풍장을 치며 두레패의 상징인 용기로 기세배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두레풍물이 형성된 순서에 따라 형제의 서열을 정해 이 순서에 따라 두레기를 수그려 서로 절을 하는 것이다.
구성 및 내용
김매기가 끝나고 노달기가 되면, 누밑마을 촌장에게 통문을 보내 회동하여 보름에서 스무날 사이에 ‘호무시 먹는 날’을 잡고, 모든 마을은 풍물을 치며 마을 앞 갱변(주위가 넓게 터진 공간을 일컫는 강원도 사투리)으로 모인다. 이때에 한 해는 바깥북실 갱변, 다음 해는 안북실 갱변으로 정한다. 열 마을의 두레패가 이루어진 뒤 먼저 맏형 깃발이 풍물을 뽐내고 자리를 마련하면, 둘째 마을 깃발이 맏형 깃발 앞으로 이동하여 영기가 가서 인사할 것을 고한 다음 용기를 낮게 세 번 쓸고 한 번 숙여 절을 한다. 그리고 맏형 깃발은 살짝 숙이는 것으로 답례를 한다. 절이 끝나면 둘째 깃발은 맏형 깃발의 왼편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세배가 끝나면, 용기를 차례로 세워놓고 각 풍물패와 주민이 한 데 어울려 대동판을 마련하고 논다.
자료출처
- 출처 : 『한국의 민속예술 50년사』
- 발행연도 : 2009.12.31
- 발행 :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민속곳간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입니다.
출처 표기 후 사용가능하나, 상업적 이용 및 내용을 변형 또는 재가공 할 수 없습니다.